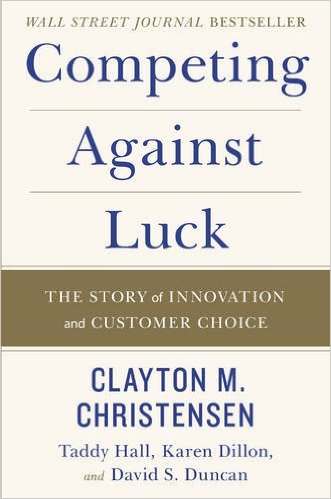만약 그동안 읽은 책 중 되풀이해서 읽고 싶은 책 몇 권을 뽑으라고 한다면 그중 하나가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교수의 ‘How Will You Measure Your Life‘일 거다. 사려 깊은 시각과 통찰력 넘치는 분석을 전해주는 그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싶을 정도이니까 말이다. 그런 그가 새 책 ‘Competing Against Luck: The Story of Innovation and Customer Choice‘을 썼다는 걸 우연히 알자마자 주저 없이 구입했다. 몇 주 정도 시간을 들여 다 읽은 게 작년 11월 말. 원래 계획은 감상을 정리해 기사로 쓰려던 거였다. 그러나 논의 끝에 블로그에 좀 더 적합한 내용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조금만 더 다듬어 올려야겠다고 한지 벌써 2개월이 되어간다. 마침 구정 연휴를 맞이해 드디어 묵혀두었던 글을 마무리해보련다.
여기 많은 주목을 받는 스타트업이 있다. 창업자 본인이 경험했던 불편함을 해결해주자는 목표로 회사를 만들어 성공적인 출발을 거두었다. 힘을 받아 더 열심히 일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반응이 시원치 않다. 결국 초기 세간의 기대와는 다르게, 조용히 문을 닫게 된다.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이다. 많은 기업들이 혁신을 목표로 조직을 만들고, 예산을 쏟아붓고, 치열한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나 정작 성공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극히 드물다. 그래서인지 혁신은 예측 가능한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운이 지배하는 개념이라 여기게 된다.
하지만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교수는 혁신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결과라고 이야기한다. 그는 ‘해결과제(jobs to be done)’ 개념에 주목한다. 고객은 어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기에 맞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용한다. 해결과제에 성공한 기업은 ‘구글링 하다’, ‘우버를 타다’, ‘네이버에 물어보다’처럼 동사로 불리기도 한다. 반면에 해결과제에 실패한 기업은 해고당한다. 고용과 해고의 개념을 회사와 직원의 관계에서만 생각해왔는데, 이를 고객과 회사에 관점으로 확장해보니 직관적으로 이해되었다.
그렇다면 해결과제란 무엇인가? 이해를 돕기 위해 밀크셰이크 사례를 한번 살펴보자. 어떤 패스트푸드 업체에서 밀크셰이크 매출을 높이고 싶어 했다. 통상적으로 고객의 성별, 연령 등을 분석하고, 경쟁제품은 어떠한지 분석해 방안을 내놓을 것이다. 그와는 달리 구매 이유를 면밀히 분석해보니, 절반 이상은 운전하며 출근하는 사람들이 1~2시간 운전 중 적당히 배부르면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기에 밀크셰이크를 구매한다는 게 밝혀졌다. 또 저녁 시간대 매출이 높기에 이유를 분석해보았다. 저녁을 먹으러 온 고객의 자녀가 밀크셰이크를 먹고 싶다고 하면, 좋은 부모가 돼보자는 마음에서 구입한다는 걸 발견했다.
밀크셰이크는 완전히 다른 맥락(출근길 운전 중, 퇴근 후 자녀와 함께 저녁식사)에서 각각의 과제(간편하게 공복감 해결, 좋은 부모 되기)를 해결해주고 있었다. 이 분석에 의거한 매출 증대 방안은 식감을 높일 수 있는 시리얼 같은 첨가물 옵션을 제공한다든가, 혹은 아이들이 한 번에 마실 수 있는 양을 판매한다든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는 해결과제를 파악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구직활동에서 기업이 원하는 자격 요건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처럼, 고객의 해결과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는 해결과제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경험하는 모든 요소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자기 자신이 느낀 불편함은 무엇이고,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따져보는 것만큼 좋은 시작점은 없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관련해서 아무것도 구매하지 않는 사람을 분석해보는 것도 좋다. 아무것도 구매하지 않는다는 건 그 무엇도 고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에, 인사이트를 얻기에도 좋을뿐더러 나아가 훌륭한 잠재고객이다.
그렇게 파악한 채용조건에 맞는 종합적인 경험을 만들고 전달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 회사는 고객이 1cm짜리 ‘구멍’을 원하는데 반해, 1cm짜리 ‘드릴’, 즉 제품이나 서비스로 접근하는 실수를 범한다. 또 해결과제를 중심으로 회사의 프로세스가 구성되어야,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 회사들은 이와는 반대로 사업팀, 제품개발팀, 기획팀 등 기능적으로 나눠져 있다. 회사에서 목표로 하는 해결과제를 명확히 정의하고, 조직 구성원이 이를 인식하고 여기에 맞도록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미션이나 목표가 필요하고, 조직 구성원들이 거기에 입각해 자율적으로 의사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
필자가 학부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면서, 늘 미심쩍게 생각하던 부분이 있다. 경영학에서 활용하는 사례연구를 보면 이 사례에서는 이렇고, 저 사례에서는 저렇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게 너무 많다는 느낌이었다. 그러다 보니 이론이 과연 어떤 효용성을 가지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졌었다. 하지만 크리스텐슨 교수는 확률을 높여줄 수 있는 건 좋은 이론밖에 없다고 이야기한다. 고객의 문제를 잘 해결해주면 혁신에 성공한다는 인과관계보다 더 명쾌한 건 없다는 그에게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게다가 회사와 업무를 뛰어넘어 아주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 배우자가 내게 이런 부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친구가 나를 보자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등 적용 가능한 상황이 무궁무진하다.
아직 한국어판은 출간되지 않았지만, 영어판의 문장이나 단어가 어렵지 않다. 일독을 강력히 권한다. 올해, 아니 인생의 책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 자신 있게 말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