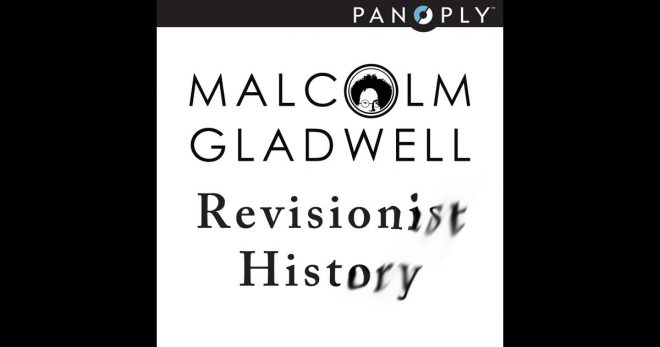‘포켓몬 고(Pokemon Go)’로 온통 난리다. 주변에 IT 종사자와 띠부띠부실을 모았던 친구들이 많아서인지 ‘난리’로 느껴진다. 숨겨져 있던 ‘포덕’들이 스멀스멀 타임라인을 장악했다. 포켓몬에 관심이 없지만, 하도 난리이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다. ‘힙(hip)’하고 ‘쿨’한 사람이 되려면 속초 가서 인증샷 올려줘야 되는 건가. 하지만 열광적인 친구들은 이미 속초에 가있다. 내가 인증샷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한발 늦은 거다.
음지에 머물러있던 ‘덕후’가 양지로 나오고 있다. 이번 포켓몬뿐만이 아니다. 레고나 베어브릭 등 장난감, 애니메이션 그리고 아이돌까지. 덕후들이 전방위적으로 올라온다. 심지어 ‘덕밍 아웃’이라는 용어도 등장했다. 이런 변화의 원인은 무엇일까. 나름대로 생각해보니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되었다.
첫째는 자기만족 소비의 증가이다. 개인의 삶을 희생하고 월급을 아끼더라도 서울 시내에 집을 사기는 어려워졌다. 노력의 과실은 줄어들고, 선천적인 요소가 더 중요해졌다. 노력해도 안될 거라는 걸 깨달으면서 순간을 즐겨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진다. 굉장히 비싼 외제차를 지른 친구는 어차피 집도 못 살 거 스스로에게 작은 선물을 준거라 이야기했다. 어차피 집 못 살 거 레고나 사야겠다. 초밥이나 먹어야겠다. 여행이나 가야겠다. 이렇게 관심사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관련 시장의 규모도 커지면서 관련 항목의 질도 좋아진다.
둘째는 소셜 미디어의 확산이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보통 자랑의 공간이다. ‘나 이렇게 잘 살고 있다!’를 암시하는 행복한 순간을 포착해야 한다. 좋아하는 것을 할 때 사람은 행복하다. 게다가 페친, 인친들은 나와 비슷한 배경과 관심사를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 소셜 미디어의 인간관계는 동질성에 기반해 굉장히 선택적으로 이뤄진다. 그러니 내 취향을 마음껏 드러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물아래 숨어있던 덕후들이 스멀스멀 위로 올라온다.
마지막 이유는 ‘개인화’이다. 대부분 미디어들은 사람 개개인에게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려고 노력한다.소셜 미디어의 콘텐츠 노출 알고리즘은 좋아하고 관심 있는걸 더 보여주도록 자기강화가 일어나는 구조이다. 소셜 미디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인터넷 서비스들은 ‘개인화’라는 기치하에 좋아하고 관심 있을 것 같은걸 파악하려고 애쓴다. 결과적으로 덕질의 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이 굉장히 쉬워진다.
그러다 보니 덕밍 아웃에 필요한 용기는 적어지고, 보상은 커진다. 행복하고 후련할 뿐만 아니라, 멋지고 힙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게 덕후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이유라고 생각한다.
자신만만해진 덕후를 보며 부러움을 표하는 사람도 있다. 대표적인 게 나다. 덕밍 아웃할 수 있는 게 없다. 좋아하고 관심 있는 건 많다. 아스날 팬사이트에 계속 들락거리며 어떤 선수를 영입할까 확인한다. 1주일에 한 번은 영화관을 가겠다며 새해 계획을 세우고, 스타워즈의 ‘타이 파이터’ 레고를 결제하며 들떴다. 가고 싶은 맛집을 적어두거나 찾는다. 하지만 전 이거 덕후예요!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없다.
몇 년 전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친구와 홋카이도를 갔었다. 하루는 오타루의 운하에서 일몰을 찍겠다고 했다. 일몰이니까 5시 혹은 6시쯤 가야겠네 생각했지만, 그 친구는 2시에 운하로 가서 좋은 자리를 맡자고 했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던 나는 더 일찍 와서 자리를 맡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경악했다. 좀 더 일찍 올걸 후회와 함께 친구는 영하 10도가 넘는 매서운 날씨 속에서 그렇게 4시간 가까이 자리를 지켰다. 친구가 참 부러웠다. 미친 듯이 몰두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부러웠다.
미친 자가 세상을 바꾼다. 세상 모든 덕후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담아 글을 마무리한다. 이상 미치지 못해 아쉬워하는 자가 적는다.
이미지 출처: https://brunch.co.kr/@brunch8m3s/7